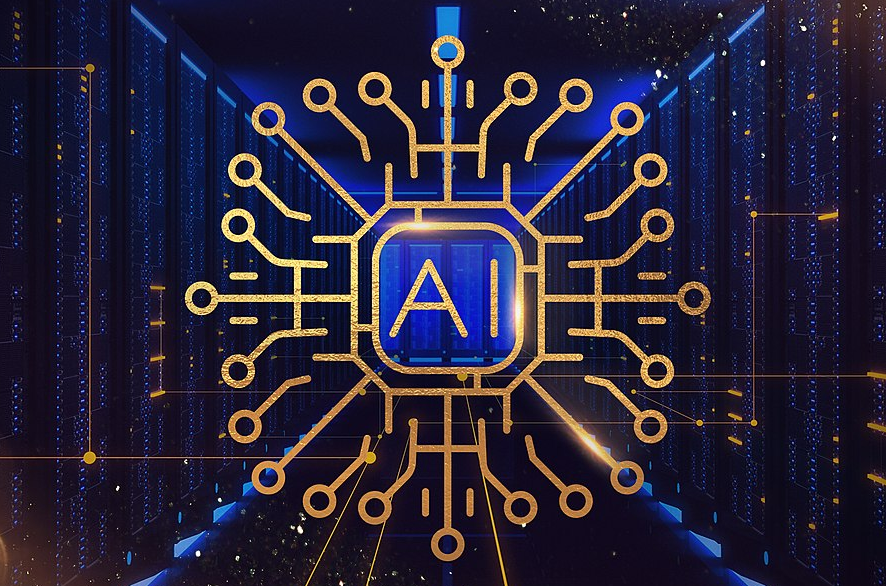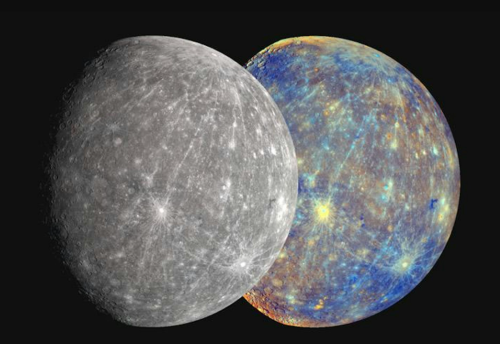출처: Rodion Kutsaiev, Unsplash.
출처: Rodion Kutsaiev, Unsplash.
중상주의자들은 한 국가의 번영을 그 나라가 보유한 귀금속의 양으로 정의했고, 국가의 진보는 그 귀금속 보유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귀금속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해야 했고, 이 무역 흑자는 귀금속, 특히 금의 수입으로 결제되어야 했다. 그렇게 해야만 그 국가의 금 보유량이 늘어났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바로 이러한 중상주의자들의 관점을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스미스는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 같은 독점 상업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귀금속의 양이 국가의 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가 보유한 자본 스톡의 양이 진정한 부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진보란 점점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과 자본의 활동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의 모든 규제를 제거해야 했다. 다시 말해 경제에 자유방임주의 조건이 조성되어야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동인도회사 같은 독점회사가 국가를 장악한 상황을 제거해야 했다.
스미스의 입장에서 눈에 띄는 점은, 비록 이전 개념과 혁명적으로 단절했음에도 여전히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여전히 국민을 넘어선 실체로서의 ‘국가의 부’를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자산의 개념은 금과 은에서 자본 스톡으로 바뀌었지만, 그 자산을 보유한 주체는 여전히 ‘국가’였다.
국가가 국민과 구별되고 그 위에 존재한다는 개념은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유럽에서 발전한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특징이었다. 이 개념은 1930년대 유럽의 파시즘하에서 정점을 찍었지만, 그 사상 자체는 부르주아 사상 전반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었다.
물론 국가가 국민 위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와중에도 ‘국익’이라는 개념은 결국 특정 부르주아 계층의 이익과 동일시되었다. 중상주의에서 애덤 스미스로의 전환은 곧 동인도회사와 같은 독점 상인의 이익을 ‘국익’으로 신성시하는 태도에서 제조업 부르주아 계층의 이익을 ‘국익’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이 계층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곧 국가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여전히 국민과는 구별되는 실체로서의 ‘국가’ 개념을 고수한 채 이루어졌다.
데이비드 리카도 역시 애덤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자본 스톡 축적을 진보의 지표로 삼았다. 그는 자본 축적이 멈추는 정체 상태로 나아갈 것을 우려했고, 이는 자본 스톡이 국가의 부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자본 축적이 멈추면 진보도 끝난다고 여겼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이 점에서 예외였는데, 그는 자본 축적이 없는 정체 상태라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이전보다 나아진 삶을 산다면 문제 될 게 없다고 여겼다. 즉, 그는 스미스나 리카도와 달리 자본 축적보다 노동자의 복지를 우선시했다. 이는 그의 아내 해리엇의 영향으로 사회주의적 입장으로 기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미스나 리카도와 같은 고전 경제학자들을 노동자의 복지보다는 자본 스톡과 생산량을 중요시했다고 해서 과하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들 역시 노동자들에게 동정심을 품고 있었지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출산율이 높아지고 인구가 증가해 노동 공급이 늘어나고, 결국 실질임금이 다시 생계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믿었다. 이 생각은 맬서스의 인구론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오직 그들 자신에게 달렸고, 삶의 질이 개선되어도 자녀 수를 줄이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만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책이 여기에 개입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정책은 자본 스톡을 늘리고 생산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고, 그로 인해 전체 분배량이 늘어나면 노동자들도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의 여지를 스미스나 리카도에게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 세대의 ‘주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에게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 맬서스의 인구론은 이미 오래전에 폐기되었고, 마르크스가 그 이론을 ‘인류에 대한 모독’이라 부른 것 역시 오늘날에는 널리 수용되는 관점이다. 그런데도 ‘주류’ 경제학은 여전히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국가의 번영 지표로 삼고, 그 성장률을 진보의 척도로 여긴다. 이처럼 진보가 자본가의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여기는 한, 국가의 이익은 자본가를 비위 맞추고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그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데 있다고 간주한다. 스미스나 리카도가 이러한 태도를 보였던 것은 (잘못이긴 하지만) 어차피 노동자가 스스로 행동을 바꾸기 전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경제학자들이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순전한 이데올로기적 편향에 불과하다.
이러한 편향의 최신 사례는 니티 아요그(Niti Aayog) 최고경영자(CEO)가 인도를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라고 발표한 것이다. 그는 인도의 국내총생산이 4조 달러를 넘어 일본을 추월했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이는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의도적인 자화자찬이었다. 예상대로 인도의 대자본가 계층도 이 발표에 열렬히 환호했다. 하지만 인도 인구가 일본보다 10배 이상 많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러한 자랑은 얼마 전 나렌드라 모디(Modi)가 인도 GDP가 곧 5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자랑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국가 규모를 떠나, 인도 GDP의 절대 규모를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GDP 자체에 집중하는 관점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맬서스주의적 세계관으로 회귀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 삶의 질이 핵심이며, 진보는 오로지 그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반식민 투쟁의 정신과도 상충한다. GDP에서 일본을 추월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개념상의 ‘국가’는 국민 위에 존재하는 실체로 여겨지며, 그 ‘영광스러운’ 성취는 국민의 삶과 무관하다. 하지만 이는 제국주의로부터 ‘국가’의 해방이 곧 국민의 해방이었다고 믿었던 반식민 투쟁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욱이, 독립한 지 75년이 넘은 현재에도 국민의 삶은 여전히 참담한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인도는 127개국 중 세계 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에서 105위를 차지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 사실에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GDP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출처] Economics and the Concept of Progress | Peoples Democracy
[번역] 하주영
- 덧붙이는 말
-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은 인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자 정치 평론가다. 그는 1974년부터 2010년 은퇴할 때까지 뉴델리의 자와할랄 네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 연구 및 계획 센터에 몸담았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